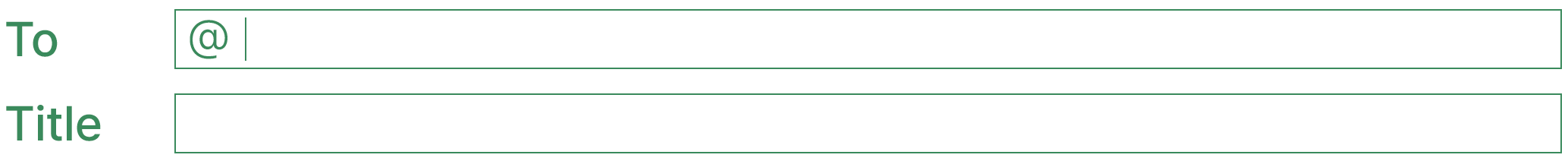편지에게.
너는 손, 화살, 유리병, 비둘기, 자전거를 구름처럼 타고 네 몸에 쓰인 이름의 주인을 찾아갔지. 그 사람들의 표정을 기억할 수 있겠니? 글자를 읽을 수 없는 넌 그들의 반응으로 내용을 추측할 뿐이었지만. 돋보기를 쓰고 민들레꽃 같은 웃음을 터트리던 할머니, 발갛게 물든 볼로 수줍게 미소 짓던 소녀, 얼굴에 검정을 묻히고 눈물을 글썽거리던 군인, 웃는 듯 우는 듯 묘한 표정으로 몇 번이고 너를 들었다 놨던 아저씨. 이들 앞에서 너는 오늘도 제대로 도착했구나 싶은 안도의 숨을 내쉬곤 했지. 반면 잠 못 이룬 날도 있었어. 어젯밤 누군가는 널 품에 꼭 끌어안고 끅끅대며 네 몸을 온통 적셨잖아. 잉크가 눈물로 번질수록 네 마음도 까맣게 물들어갔어. 긴긴밤 동안 너는 ‘종이가 운다’ 는 말의 정확한 뜻을 알게 되었지. 그 모든 날 중에서도 네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널 처음 그들에게 보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이었어. 네가 아는 너의 이름은 편지였지만, 사람들은 종종 너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곤 했어. 약속, 쪽지, 소식, 안부, 선물, 고백, 러브레터…. 누가 쓰고 받는지에 따라 내용과 글씨체는 달라도, 한결같이 나오는 문구들이 있었어. 안녕, 축하해, 고마워, 널 생각해, 부디 잘 지내, 행복해, 보고 싶어. 너는 문득 궁금해졌지. 사람들은 왜 모두 똑같은 말을 주고받는지. 그 반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던 어느 날, 너를 써 내려가는 사람의 심장 소리를 가까이서 들으며 깨달았어. 중요한 건 반복되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에도 차마 전부 담기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